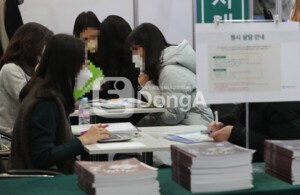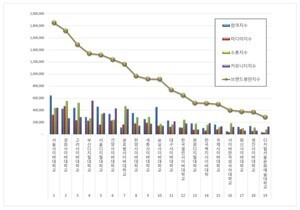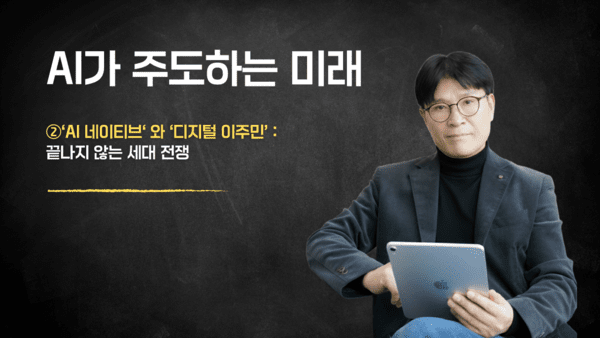
AI를 바라보는 태도는 언어 습득과 닮아 있다. 누군가는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누군가는 문법을 익히며 번역하듯 사용한다. 언어를 익히는 방식이 사고의 틀을 만들듯, AI를 다루는 태도 역시 우리의 사고 구조를 바꾼다. 결국 우리가 어떤 언어로 생각하느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달라지게 만든다.
최근 한 협력사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예전에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 숙제를 제출하면 잘한 거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제출하면 잘못했다고 했었죠.” 그 말이 오래 남는다. 정보를 찾는 방식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학습의 문법’을 배워왔다. 지금의 AI 역시 그 문법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다.
지난 1회차에서 AI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벽’을 이야기했다. 이번 회차에서 그 벽은 세대의 형태로 드러난다. AI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세대, 그리고 외국어처럼 익혀야 하는 세대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간극이다.
이 개념은 2001년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가 제시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와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는 사고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의 등장은 그 차이를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디지털 이주민’ 세대에게 AI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다. AI를 업무나 학습에 활용하지만, 결과를 검증하고 신뢰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코드와 모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 하고, AI의 답변을 ‘참고자료’로 판단한다. 이 세대에게 AI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며, 경험과 직관이 여전히 판단의 중심에 있다.
반면 AI 네이티브 세대는 다르다. 그들은 검색보다 생성이 익숙하고, 정보를 찾기보다 질문을 던져 만들어내는 감각을 체득했다. AI는 그들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파트너이자 지적 활동의 일부다. AI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외국어를 할 줄 알면서 굳이 손짓으로 대화하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문제는 이 두 세대가 같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은 “AI의 답엔 깊이가 없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직관은 너무 느리다”고 답한다. 이 충돌은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니라, ‘무엇을 지식이라 부를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진다.
AI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AI 네이티브는 이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지만, 디지털 이주민은 여전히 그것을 번역하며 배워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AI 리터러시(AI Literacy)’, 즉 공존의 문해력이다.
필자는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이 우리 사회의 소통 구조와 지식 전수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음을 우려한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AI가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의 통찰력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할까.

▶김영기 위고컴퍼니 대표이사
*[AI가 주도하는 미래] 3회차 주제는 ‘AI가 그리는 새로운 지도, 부의 격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