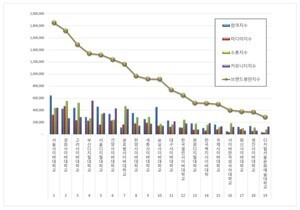코끝이 매섭게 시려오는 겨울이면 두툼한 옷을 꺼내 한파를 준비하듯, 우리 가족의 연말 전통인 발레 공연이 슬그머니 떠오른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극장에 들어서던 기억이 아직도 몽글몽글 마음을 덥힌다. 그 향긋한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나도 아이와 우리가 함께 쌓아갈 무언가를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겼다.
아이가 어릴 땐 연말에 늘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틀어두고 겨울을 보냈다. 덕분인지 처음 함께 간 발레 공연에서도 의외로 조용하고 예의 있게 관람해, 그다음 해에도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었다. 올해는 조금 이를지도 모르지만 11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국립발레단의 지젤 소식을 듣고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았다. 3학년인 아이는 예전에 읽었던 발레 명작 동화 지젤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 재밌었어!”라며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지젤은 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골 소녀다. 신분을 숨긴 귀족 알브레히트에게 마음을 줬지만, 그에게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다. 이후 밤이면 남자들을 춤추게 해 지쳐 죽게 만든다는 요정 ‘빌리’ 무리에 들어가게 되고, 지젤을 그리워하며 무덤을 찾은 알브레히트를 빌리들이 해치려 하자 지젤은 여전히 남아 있던 사랑으로 그를 보호해 낸다. 새벽이 밝아오며 빌리들이 사라지고, 알브레히트는 살아남는다.
다소 비극적이고도 서정적인 줄거리 때문에 혹시 아이에게는 무대가 다소 무겁게 느껴지진 않을까 걱정하며 공연장을 찾았다. 화려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호두까기 인형과 비교하면 무대가 단출하게 보일지도 걱정됐는데, 의외로 아이 동반 가족이 꽤 많았고 관람객들이 긴 줄을 서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모습도 어쩐지 반가웠다. “엄마, 나는 빌리들이 단체로 춤추는 장면이 제일 기대돼!” 아이는 극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 공연 내내 아이는 무언의 눈빛으로 내내 감탄을 보내왔고, 나 역시 그 눈빛 덕에 함께 깊게 빠져들어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120분이 훌쩍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마주 보고 마신 따뜻한 핫초코, 무대 위 빛과 음악을 함께 바라보던 순간, 집으로 돌아오며 나눈 작은 대화들까지—모두 한 해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우리만의 추억이 되리라.
해마다 찾아오는 공연 한 편이지만, 그 안에는 부모와 아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쌓아가는 시간이 켜켜이 담긴다. 어린 시절 내게 그랬듯, 언젠가 아이도 이 겨울 풍경들을 자신만의 기억 상자에서 꺼내보며 미소 짓겠지. 벌써부터 내년의 겨울, 그리고 또 그다음 겨울의 공연이 기대된다.
▶이해인 E동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