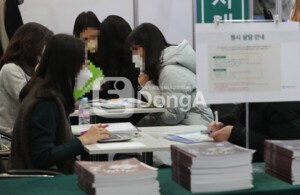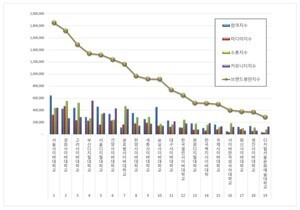초등 저학년 교실에는 각기 다른 속도와 색깔을 지닌 아이들이 모여 있다. 책을 즐기는 수준도 제각각이고, 주어진 역할에 대한 충실함과 노력의 정도도 다르다. 한 학기를 마친 뒤 교과서를 펼쳐보면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결과물이 펼쳐진다.
이 다채로운 교실 속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한 아이가 있었다. 답이 정해진 문제 앞에서는 망설임 없이 연필을 움직이고, 정답률도 높은 아이. 또 또래보다 말로 자신의 의견을 또박또박 표현할 줄 알아 조리 있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저학년 친구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아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유독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책 속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거나 명절 연휴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적는 활동처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풀어야 할 때면, 아이는 문제를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생각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단순히 아이가 글쓰기를 어려워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 번 비슷한 장면을 마주하며 깨달았다. 이 아이는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었다. 정답이 있는 문제를 빠르게 푸는 데는 익숙하지만, 스스로 무엇을 느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정리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교실에는 이런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교과서의 빈칸을 채우는 데에는 능숙하지만, 자기 마음속 빈칸을 채우는 일에는 서툰 아이들. 사고하고 표현하기보다 ‘맞는 답’을 찾는 훈련에 익숙해진 아이들이다.
교과서에 흔히 보이는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세요’ 문제 앞에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교사가 제시하는 모범답안을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대로 받아 적는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의 폐해로 손꼽은 주입식 교육의 모습이 이런 걸까?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나만의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 볼만한 일이다.
생각은 훈련으로 자란다. 누군가 대신 채워주는 답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과 감정을 돌아보며 ‘내 생각’을 꺼내는 연습 말이다. 완벽한 문장보다 중요한 건, 자기 안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본 일이 없는 아이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 정답이 빠르게 주어지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할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머뭇거리면 답을 대신 알려주거나, “그건 이거잖아” 하며 대화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아이가 잠시 멈추는 그 순간이 바로 생각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부모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아이는 스스로의 생각을 더듬어 말로 꺼내려 애쓴다. 이 과정은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학교보다 가정에서 연습하기에 적합하며 사고의 근육이 자라는 효과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둘째,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오늘 학교 어땠어?” 대신 “오늘 제일 재미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어?” “숙제 다 했어?” 대신 “이 문제는 네가 어떻게 풀 생각이야?” 정답을 확인하는 질문보다 생각을 이끌어내는 질문이 필요하다.
셋째, 정답을 도출하는 것만큼 생각한 흔적 또한 칭찬해 줘야 한다. 아이들은 맞는 답을 찾아야만 칭찬받는 경험에 익숙하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건 새로운 방법이네” 같은 말은 아이로 하여금 생각하는 일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임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는 것이다. 책을 읽은 뒤 줄거리를 외우듯 말하게 하기보다 “이 부분에서 네 마음은 어땠어?” “주인공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아이의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쌓일수록 그 아이는 조금씩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간다.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그 단순한 변화가 아이의 사고력을 길러주는 가장 확실한 교육이다.
▶이해인 E동아 객원기자